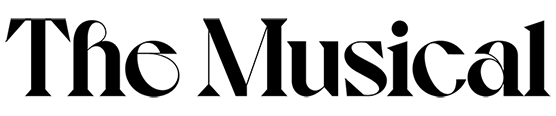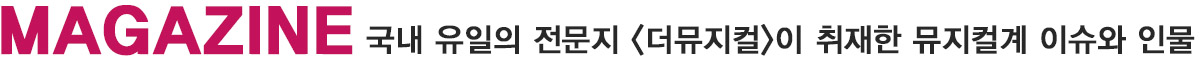열린 마음, 굳은 심지
지난해 초연된 창작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로 제1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연출상을 거머쥐며 뮤지컬계에 우뚝 솟아오른 오세혁 연출가. 뮤지컬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10년 넘게 극단을 꾸려온 연극판의 잔뼈 굵은 인물이다. 2005년, 네 명의 동료들과 함께 설립한 걸판은 과거 명절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실외에 차려 놓은 음식상 걸판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연극을 하자는 포부로 만든 극단.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포지션을 맡아 실력을 갈고닦은 덕에 현재 뮤지컬 신에서 연출뿐 아니라 작가 겸 각색자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그가 올 하반기에 연출가로 이름을 올린 작품만 모두 세 편. 올 10월 재공연되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와 안산문화재단이 제작하는 <전설의 리틀 농구단>, 우란문화재단에서 개발 중인 <순수의 시대>의 워크숍 공연이 그것이다. 작가로 참여한 <꿈빠이, 이상>과 <모래시계> 또한 개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작가 겸 각색자, 또 연출가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해를 바쁘게 보낸 소감은 어떤가.
지난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로 뮤지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은 2005년 극단 걸판을 만든 이후로 쭉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스스론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우리 극단의 자부심 중 하나가 10년 넘게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월급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순회공연을 열심히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 작업을 할 때 더 바빴던 것도 같다. 정신없이 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외부 활동보다는 극단 활동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대본을 쓴 다음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다. 아무래도 상업 프로덕션 작품을 할 때는 극단에서 하는 것만큼 과감한 시도를 하긴 힘드니까. 내 나이가 이제 서른일곱인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 싶다.
극단 설립 초창기에 교본으로 삼았던 작품이 있나?
걸판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이윤택 선생님이 이끄는 연희단거리패의 <햄릿>을 본 적이 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1막 엔딩에서 클로디어스가 햄릿의 극중극을 보다 심기가 불편해져 자리를 뜨면, 햄릿이 “왕은 연극이 싫다고 한다, 만세!”를 외친다. 그리고 곧이어 모든 배우들이 일제히 객석을 향해 “연극 만세”를 소리치면서 암전되는데, 너무나 촌스러운 그 대사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 없더라. 많은 배우들이 마치 한 호흡으로 숨쉬는 듯한 강렬한 느낌.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종류의 에너지였는데, 그런 분위기를 뿜어내는 연극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그야말로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당시의 강렬한 인상이 극단 걸판의 방향성을 잡는 데 영향을 줬을까.
그렇다. 아, 저게 극단의 힘인가. 나도 저렇게 하나의 색깔을 내는 끝내주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롤모델은 당연히 이윤택 선생님이 됐고. 그런데 나중에 운 좋게 선생님께서 심사를 맡으셨던 2011년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되면서 선생님과 인연이 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많이 배웠다. 외부 프로덕션 활동의 계기가 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연출을 맡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연출하신 백석에 관한 연극 <백석우화>를 보고 지역 일간지에 리뷰를 기고했는데, 그 기사를 본 우란문화재단의 김유철 피디한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맡아주십사 연락이 온 거다. 백석을 좋아하는 연출가를 찾고 있었다면서 말이다.
첫 뮤지컬 작업에선 어떤 매력을 느꼈나.
음악이 지닌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뮤지컬은 연극처럼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대사로 의미를 전하는 것과 음악으로 정서를 전달하는 것의 분명한 차이점을 느꼈다고 할까. 음악으로 전달되는 정서의 힘이 정말 크더라. 개인적으로 뮤지컬에선 무엇보다 음악이 잘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배우들이 노래하거나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최대한 담백하게 장면 연출을 하려는 편이다. 관객들이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솔직히 어려서 연극만 하던 시절엔 뮤지컬은 밝고 쉬운 대중적인 장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작업을 통해 그런 편견을 깰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지금은 어떤 면에선 뮤지컬이 연극보다 더 깊고 고결한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장르라고 생각한다.
하반기에 개막할 <꾿빠이, 이상>과 <모래시계>에는 극작가로 참여했다. 각각 어떤 경험이 됐나.
<꾿빠이, 이상>은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을 쓴 김연수 작가를 좋아해서 참여한 작품이다. 언젠가 김연수 작가의 『밤은 노래한다』를 뮤지컬로 만드는 게 내 목표 중 하나라, 이번 작품이 잘 나와서 작가님께 정식으로 공연화를 요청드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모래시계>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쓴 박해림 작가와 공동으로 작업했는데, 지난 5월 말에 1차 최종고를 넘긴 상태다. 대극장 뮤지컬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큰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가고 한 작품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협업을 통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창작자로서 자극을 주는 또래 연출가가 있나.
걸판의 창단 멤버이자 대표인 동갑내기 최현미 연출이 나에게 가장 자극을 준다. 극단에서 기획, 제작, 배우, 작가, 연출 등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여주인공이 활약하는 뮤지컬 3부작 <앤>, <나무 위의 고래>, <헬렌켈러>를 하나하나 선보일 계획인데 나한테 없는 감각과 감성이 그에겐 있다. 나보다 열 배는 훌륭한 예술가다. 그리고 나보다 몇 살 위라 또래는 아니지만, 김태형 연출에게 많은 자극을 받는다. 왜냐면 작품을 볼 때마다 늘 100 중에서 60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 40은 실험적인 도전을 한다고 느끼는데, 첫 대극장 뮤지컬 작업이었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도 그게 여실히 느껴지더라. 상업적인 성공이 중요한 상업 프로덕션 작품에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의 작품에서는 대중성과 실험성이 공존한다. 또 대학로에서 제일 바쁜 연출가이면서 관객 참여형 연극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지>나 즉흥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싶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나.
삼십 대 초반까지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단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어린애처럼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열심히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자는 생각이 들더라. 예전에 오태석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예술가는 누구나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구슬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령 가진 구슬이 한 개더라도 그걸 빛나게 잘 닦아서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두 개 가지고 있는 척하면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니까 정직하게 나아가란 말이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좋은 작가이자 연출이 되는 거다. 내가 꿈꾸는 이상에 도달하기까지 때론 어떤 작품을 제대로 못할 수 있겠지만 관객을, 그리고 내 자신을 절대 속이진 않겠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167호 2017년 9월호 게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