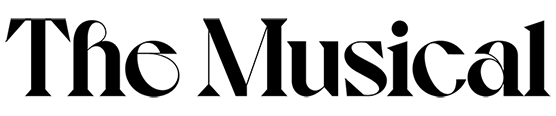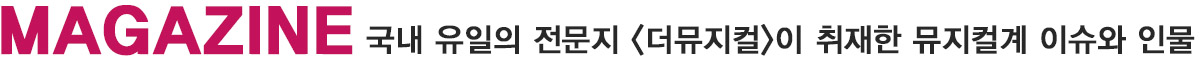어쿠스틱, 날것의 뮤지컬 ‘원스’
2006년 개봉한 잔잔한 스토리의 인디 영화 <원스>가 예상외의 반응을 일으키며 열렬한 팬층을 형성할 때도 지금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다. 큰 갈등도 상황의 변화도 없이 따스한 음악과 감성이 있던 음악 영화가 뮤지컬로 만들어졌고, 2012년 브로드웨이 최고의 작품으로 선택되었다. <원스>는 기존의 뮤지컬적인 관습을 넘어서며 색다른 매력의 뮤지컬로 탄생했다. 그 선봉에는 연출가 존 티파니가 있었다. 런던에서 새로운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존 티파니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뮤지컬 <원스>의 출발
<원스>의 뮤지컬 작업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전에도 대형 뮤지컬 연출 의뢰를 종종 받았는데, <블랙워치> 같은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제 작품들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는 거리가 멀어요. <원스>의 프로듀서가 음악이 제 취향일 거라고 하길래 호기심이 생겨서 <원스> 영화음악을 들어봤어요. 듣자마자 푹 빠졌죠. 며칠 뒤에 영화를 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걸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만든다니, 브로드웨이 작품을 보긴 한 건가? 프로듀서들이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신 나간 아이디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진을 꾸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설마 브로드웨이에 오를까 의심했어요. 브로드웨이는 이런 공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죠. 그게 2010년쯤이었는데, 2011년 초에 워크숍을 몇 차례 하면서 작품의 형태를 갖췄어요. 당시 제가 살던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아메리칸 레퍼토리 시어터에서 안무가 스티븐 호겟, 음악감독 마틴 로우, 뉴욕에서 온 배우들과 함께 선보인 공연에 대한 평가가 꽤 좋아서, 그해 말에 뉴욕 시어터 워크숍으로 옮겼고, 정신 차려 보니 브로드웨이에 올라 토니상을 받았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원스>는 전형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확실히 달랐어요.
<물랑루즈> 같은 영화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기 쉬워 보이지만, <원스>는 스토리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브로드웨이에 갈 거라곤 아무도 예상 못했죠. 영화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어요. 관객들이 음악과 연결되도록 만들고 싶었죠. ‘뮤지컬’ <원스>가 아니라 음악에 관한 연극인 거죠. 음악의 창조 과정, 치유의 힘에 관한 이야기요. 그렇게 관객들이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느끼려면 당연히 배우들이 뮤지션이어야 했죠. 특히 가이의 음악이 걸에게 깊게 다가가니까 가이는 뛰어난 뮤지션이어야 해요.
그래서 액터-뮤지션 뮤지컬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요?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음악을 만드는 이야기니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배우들을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뮤지션들을 모아 놓으면 끊임없이 연주를 해요. 서로 연주하고, 따라 하고, 끼어들고, 그게 뮤지션의 본능이죠. ‘Falling Slowly’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다른 배우들도 자연스럽게 화음을 얹고, 그러면서 관객들도 함께 연주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관객들이 악기를 들고 공연을 보러 와서 합주하는 상상도 해봤는데, 그러면 난리 났겠죠? 물론 배우들을 찾는 건 어려웠어요. <원스> 만큼 능숙한 수준으로 연주해야 하는 액터-뮤지션 뮤지컬은 아마 그동안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안무가 스티븐 호겟은 배우들이 춤까지 춰야 한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했죠.
<원스>는 음악이나 표현 방식이 일반적인 뮤지컬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술 장르 간의 벽을 무너뜨릴 때 신이 나요. <원스>로 베스트뮤지컬상을 받았으니 뮤지컬이겠지만, 저는 그게 뮤지컬인지 모르겠고 사실 신경도 안 써요. <원스>는 그냥 <원스>죠. 저는 어쿠스틱, 날것의 뮤지컬이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뮤지컬이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런 음악이 브로드웨이에서 통했다는 게 신기하고요. 모든 뮤지컬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헤어스프레이>나 <맘마미아!> 같은 뮤지컬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 취향은 <원스>예요. 여성분들이 “남자친구가 뮤지컬을 싫어했는데 <원스>는 좋아해요!”라고 말하면 제가 그래요. “그럼 남자친구가 뮤지컬을 싫어하는 건 아니네요.” 남자들도 좋아하는 공연인 거죠.
영화를 무대로 옮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연주하고 노래만 하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수한 순간을 손대지 않고 내버려두는 게 어려웠어요. 가이가 기타를 들 때, 걸이 피아노에 앉을 때 그냥 놔두는 게 관건이었죠.
<원스>만의 이야기
본 공연 전 프리쇼는 배우들이 아이리시 펍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친밀감을 주려던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음악을 나누는 기분을 느꼈으면 했죠. 저는 요크셔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브라스 밴드에서 테너 호른을 연주했어요. 아버지를 따라 리허설 하는 걸 자주 봤는데 그때 노동자들 사이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었죠.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음악으로는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작년 초에 오디션을 치르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음악이 연결고리가 돼서 소통할 수 있었어요.
프리쇼에는 영화에 나오지 않는 아이리시와 체코 음악을 사용했죠?
제가 프리쇼 아이디어를 떠올리자 프로듀서들이 노래를 더 사줄 돈은 없대요. 그래서 저작권이 만료된 아이리시 민요와 체코 음악을 찾아봤죠. 초연 배우들이 이건 어때? 하면서 연주하면, 마틴 로우와 함께 듣고, 요즘 밴드 음악처럼 다시 편곡했어요.
시작된다는 방송 없이 자연스럽게 공연이 이어지는 게 좋았어요.
20분 전이니까 들어가서 배우들과 한잔하세요! 하고 떠들썩하게 안내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일반적인 뮤지컬을 볼 때와 다른 경험을 하길 바랐나요?
관객들이 입장할 때 극장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지부터 생각했어요. 관객들이 우리들의 세계에 더 참여했으면 했죠. 공연 시작 전에 관객이 입장하면 아이스크림이나 파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나오고 관객들도 무대에 올라가서 서로 음악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첫 노래인 ‘Leave’로 들어갈 수 있게 했죠.
걸의 역할이 영화보다 커졌어요. 가이가 처음 등장할 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걸이 그를 구해주고 이끌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걸이 어떤 역할인지 생각해 봤는데, 마치 영화 <멋진 인생>에서 다리 위에 서 있는 조지 베일리 앞에 나타난 천사 같았어요. 연극은 영화보다 극단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출했죠. 가이가 다리 위에 서 있는 조지처럼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Leave’를 연주하는데, 바로 그때 그의 천사가 체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방금 연주한 음악, 당신 거예요?” 하고 묻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누군가 마침내 그의 음악을 들어준 거예요.
가이가 자살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진짜 자살은 아니지만 음악적 자살이죠. 글렌이 저희 리허설을 보러 왔을 때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이가 기타를 버리고 간다는 거죠. 뮤지션이라면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기타를 그냥 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타 케이스를 열린 채로 내버려둬요. 마치 파헤쳐진 무덤 같죠. 제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이의 첫 넘버를 ‘Leave’로 택했나요?
영화 사운드트랙을 처음 들었을 때 ‘Gold’는 가이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부르는 노래여야 하고, ‘When Your Mind's Made Up’은 녹음실에서 연주하는 곡이어야 했고, ‘Falling Slowly’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곡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라 그런지 ‘Leave’가 유난히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영화에서 걸이 처음 듣는 가이의 노래는 ‘Say It to Me Now’죠. 하지만 저는 ‘Leave’가 더 큰 분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날 내버려두고 가버려, 인생아’ 이러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첫 노래여야 했어요.
‘If You Want Me’를 보면 복잡한 심리를 안무로 표현한 것 같은데, 안무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배우들이 악기를 들면 연주에 끼지 않고는 못 배기듯이, 노래를 들으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못 배길 때가 있잖아요. 안무가 추상적이진 않아요. 뭔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몸이 말하는 거죠. ‘If You Want Me’는 숨을 쉬는 것 같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걸은 완전히 닫혀 있어요. 남편 문제에, 딸과 함께 더블린에 남겨져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날 걸의 야망과 삶에 대한 느낌이 가이의 음악과 만나면서 자신의 창조성을 열어젖히게 돼요. 가이가 가사를 써달라고 했을 때 걸은 신생아처럼 첫 숨을 쉬는 거예요. 관객들이 안무를 보면 그런 감정이 느껴지겠죠. 걸 안에는 강렬한 욕망이 있으니까 “네가 원한다면 날 만족시켜줘”라고 말하죠. 걸은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잖아요.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걸이 피어나고, 창조성이 깨어나면서 뭘 하느냐, 가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배우들이 소품을 옮길 때도 안무가 있던데요.
그게 제 스타일이죠. 스티븐 호겟과 작업할 땐 항상 그래요. 저는 무대 위에 세계를 창조하는데, 무대감독이 올라와서 소품을 옮기면 그 관계를 깨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배우가 옮기도록 해요.
<원스>에서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나요?
결말 부분의 정직함이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꼭 할리우드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안의 한 부분을 열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죠. 저는 그게 여행 같아요. 어떤 분이 <원스>를 보고, 지금껏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본 것 같다고 말해 준 적도 있죠.
한국 공연은 봤어요?
공연은 못 봤지만 배우들을 전부 캐스팅했죠. 호주에 있을 때 공연 촬영본을 봤어요. 한국 배우들은 정말 멋지고 훌륭했어요. 환상적인 뮤지션, 뛰어난 배우였죠.
내년에 연극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Harry Potter and the Cursed Child)>를 연출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지금 제 앞에 대본이 놓여 있어요. 작가 J. K. 롤링, 극작가 잭 손과 18개월가량 작업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구상했죠. 롤링은 환상적인 이야기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현재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죠.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144호 2015년 9월호 게재기사입니다.
* 본 기사와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