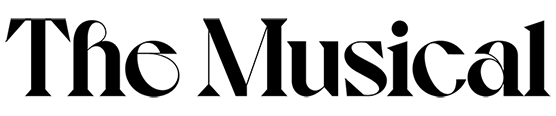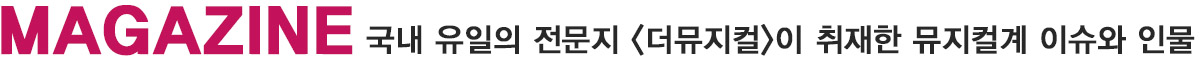Culture In Musical <락 오브 에이지>와 LA 메틀
선셋대로의 별들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1990년대 중반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허리케인 블루’라는 것이 있었다. 개그맨 이윤석과 김진수가 장발 가발을 쓰고 징 박힌 가죽옷에 굵은 체인을 감고 나와서 ‘쉬즈 곤’이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록 넘버를 열정적으로 립싱크하는 쇼였다. 입을 벙긋거리면서 온갖 로큰롤 제스처를 재연하는 두 남자의 모습이 개그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미 록 뮤지션들의 과장된 스타일이나 스테이지 액션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열정이 농담거리가 되는 일이야 흔하지만, 1980년대의 LA 메틀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후대로부터 받은 놀림은 유난스러운 데가 있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LA 메틀 밴드들은 저마다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정통 메틀에 비해 멜로디가 강조된 대중 친화적인 노선을 걸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과시적인 연주, 불꽃과 스모그가 가득한 화려한 무대 연출은 볏을 세운 수탉이나 깃털을 활짝 펼친 공작과 다르지 않았는데 이 또한 당대의 트렌드였다. 화려하고 과시적이면서 심각하고 유머가 부족하면, 시니컬한 후대의 공격 앞에 무방비가 되기 쉬운 법이다.
강력한 마초주의와 여성 팬들을 유혹하는 메이크업이 혼재해 있었던 이 ‘씬’의 대표주자로는 머틀리 크루, 스키드 로우, 미스터 빅, 본 조비, 익스트림, 그리고 최후의 공룡 건스 앤 로지스가 있었다. 우리의 록 스타들은 하나같이 마약 문제와 여성 편력,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스캔들 메이커로서 악명을 드높이면서 1980년대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향유하는 소비문화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대중음악계의 특정한 무브먼트에 지역명이 붙을 때는 사회적인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가 많은데 정치적인 발언과는 거리가 멀었던 LA 메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LA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선셋 스트립에서 네온사인 불빛처럼 빛났던 록 스타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기도 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소년들은 비슷한 환경의 단짝과 밴드를 결성해서 분노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청운의 꿈을 키운다. 그들은 스물이 갓 넘으면 트럭 운전이나 자동차 정비로 번 돈을 모아 LA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기타 말고는 가지고 올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고향집을 뒤로 하면서, 자기 앞에 결정되어 있는 백인 하층민의 삶 대신 화려한 록 스타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 꿈을 현실화시킨 극소수의 승자들이 바로 LA 메틀의 대표주자들이다.

록 스타의 방만한 사생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루피들의 전성기도 이때다. <록 오브 에이지>에서 배우 지망생인 쉐리가 록스타 스테이시와 하룻밤을 보낸 후 곧바로 버림받는 사건은 당시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슈퍼모델 약혼녀와 리무진을 타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고, 2만 명을 앞에 두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끝내주는 쇼를 하고 나면 백스테이지에는 온갖 수를 써서 출입증을 손에 넣은 그루피들이 하룻밤 간택을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추파를 던지는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될 리 있나.
이 장르가 어떤 음악 무브먼트보다 순식간에 조로하고, 비웃기 좋은 농담거리로 전락한 것은 그들이 벌였던 파티가 어느 때보다 요란하고 호사스러웠던 탓이기도 하다. 최고로 막나가면서 놀고 난 다음 날이 가장 공허한 법이다. 머리보다 몸을 쓰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었던(그 상대가 맘에 안 드는 라이벌 밴드의 멤버이기도 하고, 그루피이기도 했다) 글램메틀 밴드들을 시대착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퇴물로 밀어낸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적으로 보였던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가 아니었다. 춥고 바람 부는 도시 시애틀 출신의 우울한 너바나와 그 동료들이었다.
커트 코베인이 이끈 너바나는 그 자신들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거대한 에너지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집어삼켰다. 펄 잼, 사운드 가든, 스매싱 펌킨스 등이 그들과 동일 세력으로 분류되었다. 마약과 그루피와 멋진 차와 섹시한 애인만 있으면 사는 데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은 이들은 더 이상 동시대의 고민과 욕망을 담아낼 수 없다는 확진이 떨어졌다. 그 대안(Alternative)으로 떠오른 자가 기타도 제대로 칠 줄 모르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를 웅얼거리고, 간간히 엄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철지난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서는 음울하고 괴상한 사내 커트 코베인이었으니, 하루아침에 몰락한 왕국의 군주와 기사 신세가 된 메틀 밴드와 그 팬들로서는 황망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락 오브 에이지>에도 나오는 “커트 코베인이 모든 것을 망쳐놨어”라는 투덜거림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거대한 허영의 제국, 할리우드를 끼고 승승장구하던 LA 메틀이 순식간에 몰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의 ‘순진함’에 있을 것이다. 마약과 폭력, 섹스를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걸었던 머틀리 크루 식의 악동형 밴드와 본 조비처럼 비교적 안전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달콤한 연인형 밴드까지 나름 차이가 있었지만, 대중이 감지한 시대정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85호 2010년 10월호 게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