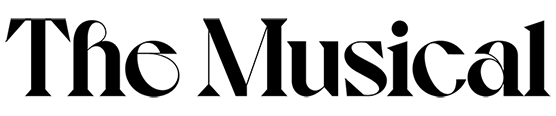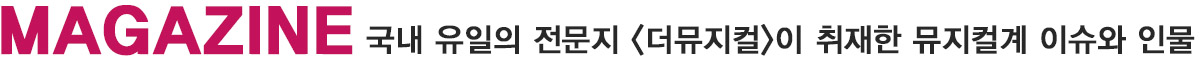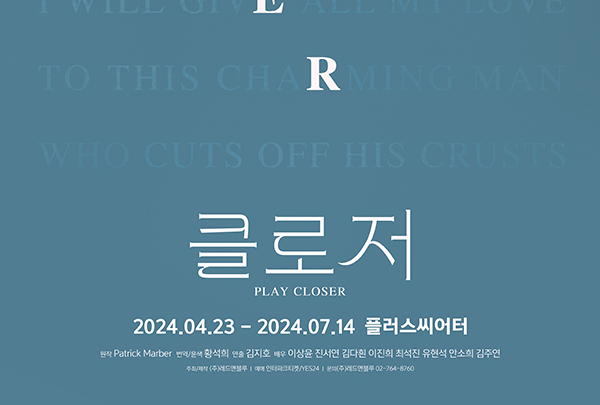관객을 감동시킬 것을 찾아라
왕연출의 연출 경험담
어린 시절부터 연출가를 꿈꿨던 나는 서울예대 연극학과에 진학했다. 학과 엠티를 갔을 때였는데, 해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외딴섬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았다. 친구와 누가 먼저 도착하나 내기를 하고 헤엄을 쳤다. 한겨울에 죽을 각오로 헤엄을 쳐서 간신히 도착했는데, 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죽을 정도로 해서 얻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허탈했다. 그때의 경험에서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대학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때 했던 무대나 조명 스태프 일은 무대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었다. 첫 작품은 스물다섯 살에 올린 <서푼짜리 오페라>였다. 조폭이 은행을 털고, 사이비 교수가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는 내용이었다.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갱스터 랩 뮤지컬을 선보였다. 반응이 좋았다. 대학로에서 <라이어> 다음으로 티켓을 많이 팔았다. <서푼짜리 오페라>를 만들 때 제작사도 없고 돈도 없었다. 친구 10명이 30만 원씩 모아서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 돈이 없었던 친구들은 노가다 일을 해서 자기 몫을 마련했다. 그 돈으로 대관료를 내고 티켓을 만들었다. 각각 1만 원에 100장씩 팔아서 제작비를 모았다. 많은 일들에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전단을 돌리기도 하고, 패션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했다. 패션 촬영은 세트 안에서 컨셉을 잡아서 촬영하는 게 연극이랑 똑같았다. 그때 경험 때문인지 내 작품 사진을 보면 구도가 나쁘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인데 어느 날 박용전 작곡가가 찾아왔다. <밑바닥에서>를 올리자고 했다. 연극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던 때라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내 처지랑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라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로맨틱 코미디가 유행하던 시절에 이런 어두운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크게 흥행했다.
이후 젊은 연출가로 주목을 받으면서, 몇몇 제작사와 작업이 진행됐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햄릿>을 하게 됐다. 체코 뮤지컬인데 로버트 요한슨이 브로드웨이에 올리려다가 그러지 못하고 창작 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햄릿>은 내가 참여한 첫 라이선스 뮤지컬이었다. 예전에는 글 쓰는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원작자를 설득하는 게 고민이었다. 그렇게 <햄릿>을 마치고 나서 <삼총사> 연출 의뢰를 받았다. 달타냥을 맡을 배우와 체코에 갔다. 그 배우는 공연을 보더니 가면 쓰고 아동극 하면 딱 좋겠다며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체코 뮤지컬은 달타냥과 리슐리외 추기경과의 권력 다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삼총사는 조연에 불과했다. <서푼짜리 오페라> 때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과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품을 할 때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우리 관객들이 <삼총사>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삼총사의 우정과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작했다. 다행히 음악이 많아 멜로디만 남기고 가사를 다 바꿔 새롭게 편곡했다. 거의 창작이었지만 크리에이터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는 없었다. 그때만 해도 창작뮤지컬은 투자를 받을 수 없어 라이선스로 포장해야 했다.
<삼총사>가 크게 흥행한 후, <잭 더 리퍼>의 연출 제안을 받았다. 체코의 <잭 더 리퍼>는 성불구자가 성적 능력을 얻기 위해 악마의 유혹에 빠져 살인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저히 그냥 하기는 힘들었다. 고민 끝에 이 사건이 미해결 사건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여왕까지 관심을 가졌지만 해결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 미해결 사건으로 만든 것이라고 가정했다. 누가 왜 그랬을까? 그런 고민 끝에 바뀐 <잭 더 리퍼>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앤더슨 형사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사건 일지를 불태우는 것이다. 무늬만 라이선스인 이 작업을 또 하는 것에 대해 이성준 음악감독이 힘들어했다. 우리에게 투자할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런 후 왕용범 프로덕션을 차리고 선보인 것이 <프랑켄슈타인>이다. 원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프랑켄슈타인>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이라고 했다. 그래서 책을 다시 읽었는데, 괴물과 빅터가 사랑했구나, 하는 걸 느꼈다. 이들이 서로를 죽일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 봤다. 그들의 관계에 몰두하게 됐고 거기서 얻은 것이 외로움이라는 코드였다. <프랑켄슈타인>을 준비하던 차에 충무아트홀에서 연락이 왔고 드디어 우리의 이름으로 공연을 올리게 됐다.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유럽 뮤지컬을 모방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삼총사>나 <잭 더 리퍼>는 유럽 뮤지컬의 모작이 아니라 내 스타일의 작품이다. 체코 작품은 음악 스타일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편견을 받아야 해서 심적 고민이 많았다. 이런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숙제일 것 같다.

질의응답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자신의 궁금함을 쏟아냈다. 그 궁금증을 자상하게 풀어주다 보니 8시에 시작한 강의는 10시 30분이 되어서야 끝났다. 드레스 리허설과 테크니컬 리허설 때 연출의 태도를 묻는 학생에게는, <올 슉 업> 리허설 때 연락을 줄 테니 직접 와서 보라며 메일 주소를 받아가기도 했다. 질의응답 중 일부를 정리했다.
연출 스타일은 어떻게 만드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관객들이 좋아하는 개성이 될 것이다.
연출의 역할은? 연출은 캐스팅만 하는 이도 있고, 무대와 조명까지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든 연출의 역할은 작품을 책임지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비즈니스다.
다른 분야의 스태프와 어떻게 조율하나? 힘이거나 신뢰다. 둘 중 하나는 지녀야 한다. 조무래기 연출 시절에 민경수, 한정임, 서숙진 등 각 분야의 전문 스태프들을 만났다. 많은 설득과 믿음을 주는 과정이 있었다. 신뢰는 단시간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경험과 팀워크를 통해 얻어진다.
연출은 얼마나 버나?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다.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못하면 다음은 없다.
배우들의 연기 지도는 어떻게? 처음에는 모든 장면을 내가 시범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정리는 잘 됐지만 그들의 연기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런스루까지 빨리 진행한다. 거기까지가 연출로서 작품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큰 틀이고 나머지는 배우들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133호 2014년 10월호 게재기사입니다.
?* 본 기사와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