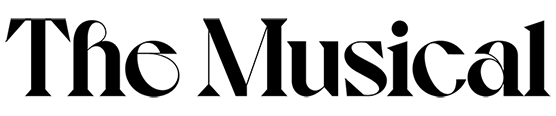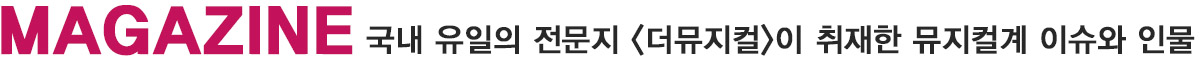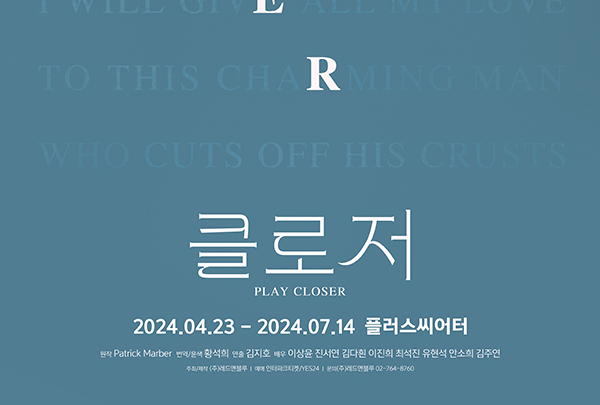만일 당신이 ‘뮤지컬 마니아’라고 자신한다면 한 가지만 질문하자. 뮤지컬을 번역하는 사람 중에 이름을 알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한두 명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대단한 마니아이다. 한 명도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뮤지컬 번역가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뮤지컬을 보았다. 입에 맞지 않은 가사 때문에 공연을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꼈다. 인터미션 때 프로그램에서 번역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두 가지 혐의를 둘 수 있다.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번역을 한 후에 연출이나 음악감독, 배우가 연습을 하면서 다듬었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긴 번역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작업을 한것. 아무래도 전자에 혐의가 더 가는데 실제로 많은 제작사에서 아직도 번역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뮤지컬 시장이 공연 시장의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면, 그것의 70퍼센트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몫이다. 라이선스 공연을 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번역가이다.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초벌 번역을 해주어야 배우나 연출가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번역의 실수는 치명적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슈베르트의 ‘숭어’의 노랫말은 이렇다. ‘거울 같은 강물에 숭어가 뛰노네, 화살보다 더 빨리 뛰어 노네’이다. 그런데 숭어는 바닷 물고기이다. 도대체 이 낚시꾼이 낚시대를 드리운 곳은 어느 바닷가이길래 이런 가사가 나올까? 문제의 해답은 엉뚱한 곳에서 풀린다. 낚시꾼이 있던 곳이 특이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의 물고기가 ‘숭어’가 아니라 ‘송어’의 오역이었다. 독일어 ‘Forelle(송어)’를 국내 번역자가 ‘숭어’로 오인한 것이다. 뮤지컬에서도 이러한 사태는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오역의 문제 이외에도 문화적인 상황, 대화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한국말 대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말로 적합하게 고칠 수 있는 번역가가 많지 않다. 번역가에게는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원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렇게 보면 출판의 번역 문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뮤지컬에서는 노래 가사가 끼어들면서 좀더 복잡해진다. 우리가 익히 아는 팝송을 한국말로 부를 때 그 민망함이란 참으로 참아주기 곤란하다. 그것은 노래의 운율이나 멜로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말로 의미만 갖다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이다. 그 민망함을 덜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음절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고 개사를 해야 한다. 번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직역과 의역에 대한 것이지만, 뮤지컬 노래를 번역할 때는 직역을 하기 어렵다. 정해진 멜로디가 있고 그 안에 가사를 끼워 넣어야 하는데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뮤지컬 넘버들을 보면 가사 배열에 각운(라임)을 맞춰서 독특한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어 구조상 그러한 라임을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기본 리듬은 강박이 앞에 오는 구조이다. 굿거리 장단이나 세마치 장단 등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장단들을 보면 앞에 강박이 온다. 민요 ‘닐리리야’를 봐도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앞에 강박이 들어가면서 두운이 맞춰지고 있다. 우리말의 구조상 두운을 강조하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라임이 발달한 서양의 가사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뮤지컬 번역자(개사가)들은 이외에도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면서 원작의 의미에 좀더 가깝게 담아내기 위해 수천 번에 걸쳐 문장을 고치고, 단어를 바꾸기를 거듭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작품의 감동을 되살릴 수 없고 입에 붙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사에서는 뮤지컬 번역에 너무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지난 <더뮤지컬> 69호에서 뮤지컬 음반 기사를 다루면서 1990년대에 만든 라이선스 뮤지컬 음반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 너무나도 날것 그대로 된 가사를 들으며 웃음을 금치 못했다. 에포닌이 죽어가는 노래나, 토니와 마리아의 사랑의 노래에 ‘개그 콘서트’를 능가하는 생뚱맞은 표현들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작품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 뮤지컬계도 많은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뮤지컬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두 명의 번역가 박천휘, 이지혜 씨의 실제 작업들에 대해 들어보고,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돈 주앙>의 개사를 맡은 유명 작사가 박창학 씨를 인터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