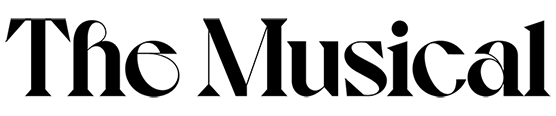2010년 이후 4년 간 무대를 떠나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했잖아요. 복귀하려니 힘든 점은 없었나요?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연기를 하려니까 무대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법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오디션 원서를 써놓고 용기가 안 나서 못 보낸 적도 많고, 보냈다가 떨어진 적도 많고, 원서는 붙었는데 겁이 나서 오디션장까지 못간 적도 많아요. 한번은 용기를 내서 찾아갔더니 공개 오디션인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위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프로필 보니까 <위대한 캣츠비>, <그리스> 주연하셨네요. 근데 왜 이거 하려고 하세요?” 전 당황해서 작품이나 역할 크기 같은 건 상관없고 그냥 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대답했죠. 심사위원이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절 쳐다봤어요. 거기서 노래, 춤, 연기를 다 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디션장을 나설 때까지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울고 싶고 숨고 싶었죠. 그래도 계속 오디션에 도전했던 걸 보면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컸던 것 같아요.
무대로 돌아오니 좋던가요?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가 아니라 ‘허투루 서게 될까봐’. 무대는 되게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허투루 서서는 안 되는 곳이죠. 돌아오니 너무 무서운데, 그 무서움이 좋은 거예요. 직장생활 4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이 무서움으로 인해 맞닥뜨리는 스트레스가 더 힘내서 견딜 수 있더라고요. 다시금 깨달았죠. 아, 내가 선택해야 할 직업은 이거였구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감정 절제가 어려운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연기하기 어려운 장면은 뭐예요?
백석의 솔로곡 ‘어느 사이에’가 끝나고 백석과 자야가 만나는 장면이요. 실제로는 자야의 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어려워요. 백석한테 되게 투정부리고 싶어지거든요. 사실 이 작품에는 감정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대사가 거의 없어요. 다 밑에 깔려 있죠. 백석과 자야의 첫 대사가 ‘여보 나왔어’와 ‘또요?’인데요, 여기에도 생략된 말이 길어요. ‘아이고, 날 보려고 매번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다니, 나야 너무 좋지만 또 이렇게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달려왔단 말이에요?’가 줄어서 ‘또요?’가 된 거거든요. 이런 대사가 많다 보니 모든 장면이 어려워요. 그중에서도 ‘어느 사이에’가 끝난 뒤에는 ‘춥지요’라는 첫 마디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무대에 흐르는 공기부터 다르거든요. 그 공기는 노래를 부르는 배우가 아니라 듣는 관객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시의 매력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어느 사이에’는 모든 관객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 텐데, 그 생각이 모여 흐르고 있는 공기에 들어서면 어쩐지 왈칵 울음이 터질 것 같아요. 묘한 경험이에요.
매거진 PS는 지난 호에 지면의 한계 혹은 여러 여건 등으로 싣지 못했거나 아쉬웠던 혹은 더 담고 싶었던 뒷이야기를 담는 섹션입니다. 관련 기사 원문은 <더뮤지컬> 11월호 '[PEOPLE|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정인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기사,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