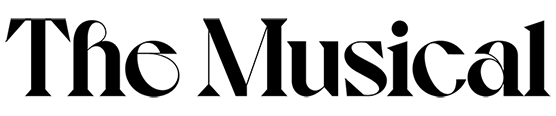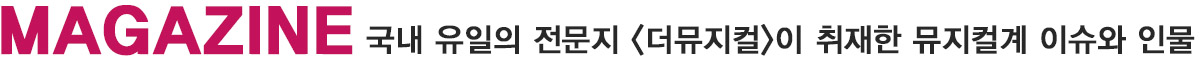사무엘 베케트와 폴 클로델과 더불어, 20세기 서양 연극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극작가이자 전쟁의 참상을 겪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기록했던 시인, 연극이나 음악극을 좋아하는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작곡가 쿠르트 바일과 함께 만든 <서푼짜리 오페라> Die Dreigroschenoper 는 유럽 음악극 전통에서 조금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28년 8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태생 자체에서 대중취향의 오페라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귀족풍의 헨델식 오페라를 비꼬기 위해 1728년 영국에서 초연된 후 미국에서까지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존 게이와 조안 크리스토프 피푸치의 <거지 오페라>를 원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독일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인 바그너 스타일의 오페라를 조롱하고자 했던 바일의 음악이 더해지면서, 내용이나 음악 모두 반바그너적이고 반부르주아적인, 즉, 당시 오페라 향유층(귀족)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할만한 뒷골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은 초연 이후 1년간 유럽 전역에서 4천2백 회나 상연될 정도로 관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인기를 끄는 ‘젊은 클래식’ 작품이 되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적인 오페라 계에서 도둑이나 사기꾼이 주인공이고 창녀 등 그저 그런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 ‘불온한’ 작품이 반가울 리는 없다.
오페라 역사에서 유일하게 제목에 ‘오페라’라는 단어를 당당히 사용하고 있지만 오페라 극장에서는 공연되지 않는 이 작품은 오히려 집 밖에서 더욱 대접받고 있다. 여기에, 브레히트와 바일이 갖는 연극, 공연계의 위상과 그들이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사회정치적인 메시지가 더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해야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작품이 되었다. 브레히트가 창립한 극단 베를리너 앙상블 Berliner Ensemble 과 현대 공연계의 스타 연출가 로버트 윌슨 Robert Wilson 이 <서푼짜리 오페라>를 통해 조우했을 때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가 막막할 정도였다.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
파리 시립극장에서 무대미술, 조명, 연출을 맡은 로버트 윌슨이 베를리너 앙상블 배우들과 함께 만든 <서푼짜리 오페라>를 보고 난 후 필자는 ‘윌슨이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거지 오페라>를 바탕으로 <서푼짜리 오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작품에 절반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쿠르트 바일에 대한 담론은 거의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윌슨이 바일의 음악을 거의 그대로 작품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극의 역사에서 브레히트가 주창한 ‘서사극’, ‘소외효과’만큼 많은 담론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개념도 없을 것이다. 그것들의 정확한 의미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브레히트가 그런 개념들을 통해 연극으로써 무엇을 성취하고자 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 배경을 간단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등장하기 전인 바이마르 문화의 전성기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가장 앞선 이성과 문명을 지녔다고 확신해오던 서구 지식인의 손에 묻은 피는 쉽게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았다. 혹자는 이런 불편한 시대상을 거부하며 소시민의 소소한 욕망을 충족하는 작품으로 도피해갔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참혹함을 잊어버리려는 세력들을 불편하게 할 만큼 사실적인 그림, 소설, 시 등을 발표했다. 피에 대한 반성과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믿었던 이들은 예술을 수단삼아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분출해냈다. 그들 중 한 명이었던 브레히트는 연극을 통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교훈극이라도 극적인 재미가 있어야한다고 믿었다.
브레히트의 작품들은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브레히트와 바일이지만, 작품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브레히트는 음악을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자신이 쓴 희곡에 종속되어야한다고 생각했고, 바일은 음악극인 오페라의 형식을 잘 이용해 음악과 문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6년여 동안 <마호가니>, <서푼짜리 오페라>, <마하고니시의 흥망>, <일곱 개의 대죄> 등을 함께 작업을 했고, 그 결과는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성공적이었다.


Simple + Colorful + Expressive = 로버트 윌슨
브레히트는 희곡 속의 대사가 그대로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 의해 말로 재연되어야한다고 믿었던 시대의 극작가이다. 하지만 연극이 대본에 적힌 ‘글’을 무대 위에서 ‘말’로 옮기면 되던 시대는 1970년대 즈음으로 끝났다. 더 이상 연극이 희곡을 무대로 옮기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대에서 배우들은 작가가 써놓은 대사를 그럴 듯하게 말하는 인형이 아니라고 외치는 연출가들이 등장한 것이다. 연극에서 수천 년을 이어오던 성스러운 힘이 ‘대사(텍스트)’에서 벗겨나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무대를 장악하던 텍스트의 힘을 무엇이 이어받아야할 것인가?
누군가는 그 힘을 ‘배우’에게 내어주었고, 누군가는 ‘볼거리’에 위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배우와 관객의 관계’ 등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연극에서 텍스트가 지배하던 줄거리가 아닌 텍스트 다음에 올 무엇을 찾아야한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1971년 파리에서 한 마디의 대사나 줄거리, 극적인 전개도 없이 세 시간에 걸쳐서 실제 벙어리들이 배우로 등장한 <벙어리 눈짓> Deafman Glance 으로 충격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던 로버트 윌슨 역시, 연극이나 공연은 이제 텍스트가 아닌 ‘상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한다고 믿었다.
공연의 본질이 상연의 문제로 옮겨갈 때, 상연의 무엇에 중심을 둘 것인가는 전적으로 연출가의 선택이다. 윌슨은 독일 표현주의와 1970년대 뉴욕 추상주의가 결합된 듯한 시각적인 무대를 택했다. 건축과 미술을 전공한 그는 작품 전면에 시각적으로 아주 심플하지만 상징성이 충만하고,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무대를 내세웠다. 그의 작품이 마치 잘 만들어진 한 점의 그림들이 연이어 소개되는 비주얼극과 같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그는 무대에서 원작의 텍스트 자체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연출가라기보다는, 자기가 파악한 내용을 독창적인 스타일의 조명과 의상, 분장 등으로 풀어내는 훌륭한 비주얼 아티스트에 가까운 연출가라 할 수 있다. <서푼짜리 오페라>에서도 그는 장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무대 장치로 관객석에서 얕은 탄식이 흘러나오게 했다. 관객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는 연출가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런 감각적인 비주얼 무대가 과연 <서푼짜리 오페라>가 담고 있는 주제의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작품의 본질과 재미의 균형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라면 공연을 보기도 전에 먼저 기가 죽어있는 관객들이 꽤 많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유명한 작품이니, 재미없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이곳에서 재미가 없으면 역사적으로만 유효한 작품일 뿐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 여기의 관객에게도 여전히 제 에너지를 쏟아낼 때면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을 받게 된다. 그렇게 또 한 편의 클래식이 탄생하는 것이다. 나는 셰익스피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서너 편의 무대극 <햄릿>은 좋아한다. 각 극단들마다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로버트 윌슨의 <서푼짜리 오페라>는 재미있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윌슨은 거의 모든 시청각적 요소들을 총 동원해서 1막이 시작하자마자 원작의 브레히트를 깔끔하게 잊게 만든다. 브레히트-쿠르트 바일의 조합이 만들어낸 작품이 윌슨-바일로 변화되었을 때, 윌슨은 브레히트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다(줄거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즉, 윌슨은 브레히트와 바일이 만들어낸 작품을 하나의 소재로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다시’ 만들어냈다. 물론,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브레히트 희곡을 좋아하는 관객에게는, 그 내용이 형식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윌슨의 <서푼짜리 오페라>가 겉만 번지르르한 속물적인, 더 나아가서 미국적인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만약 브레히트가 살아있었더라도 과연 윌슨을 연출가로 선택했겠느냐고 의심해볼 수도 있다. 원작이 가지고 있던 정치사회적 메시지와 음악극적인 성찰의 조화가 윌슨이 개입되면서 무너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윌슨이 만든 이 작품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연출가의 독특한 스타일로 잘 통합된 리바이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윌슨의 <서푼짜리 오페라>를 ‘좋은 리바이벌 작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은 브레히트의 그것보다는 분명 예술작품으로서의 깊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거지 오페라>에서 <서푼짜리 오페라>로 이어지던 내용의 진보성과 비판성은 많이 탈색되고, 시각적으로 세련되게 마감된 무대미술만이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마치 생화의 생명력과 향기가 거세된 화려한 조화 같다고나 할까. 물론 ‘재’해석된 공연을 두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연출가에게 가혹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해석이 현재의 관객에게도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과 불평등한 인간의 삶에 대한 비판’이라는 원작의 에센스를 잃어서는 안 된다.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가 가진 본질이 윌슨의 화려한 비주얼 무대로 바뀔 때, 자본주의와 부르주아계층에 대한 조롱과 비판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오페라라는 부르주아 장르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브레히트가 연극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재미있는 (교훈) 서사극’이 단순히 ‘화려한 비주얼극’으로 탈색된 것 같아, 시각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생각할 무엇은 없는 작품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예술을 단순히 그럴 듯한 볼거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관객들이 윌슨의 <서푼짜리 오페라>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푼짜리 오페라>
베르톨트 브레히트 극, 쿠르트 바일 음악, 로버트 윌슨 연출
파리 시립극장 Theatre de la ville de Paris
2009년 9월 15일~18일 / 2010년 4월 1일~4일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 81호 2010년 6월 게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