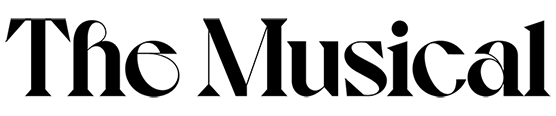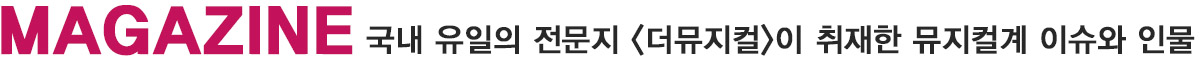지난 4월, 음악극이라는 컨셉과 뮤지컬 배우와 뮤지션의 만남으로 신선한 화제를 낳았던 ‘천변 음악극’ 시리즈가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을 찾는다. 1930년대의 음악을 선보였던 첫 시리즈 <천변살롱>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은 1960년대 클럽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천변 카바레>다.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과 요절로 대중의 가슴에 묻힌 60년대 아이콘 배호와 카바레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인공 춘식의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영화와 뮤지컬을 통해 70년대 고고장, 80년대 흑인 대중음악계, 80년대 미국 LA락 신을 섭렵하고 돌아온 최민철과 지난 9월 앨범 <동백아가씨>로 전통가요의 재해석을 시도한 재즈아티스트 말로다. 예상치 못한 조합이라고? 그루브한 리듬이 녹아 있는 말투의 배우 최민철과 빠르고도 조근조근한 말투의 유쾌한 재즈 아티스트 말로의 만남에서 묘한 밸런스와 어울림이 느껴졌다.


의외의 조합이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최민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작년 연말에 출연을 결정하고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박)준면이랑 하림 씨가 하는 <천변살롱>을 봤다. 굉장히 재미있었다. 두 번째 작품인 <천변 카바레>는 60년대를 풍미한 가수 배호를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그 세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몰랐다. 대본 보고 음악을 들어보는데, 나랑 목소리가 정말 비슷하더라. 확 끌렸다. “어우, 목소리 되게 좋은데, 이 사람?” (웃음)
말로 하하하. 자화자찬? (좌중 웃음)
최민철 알고 보니 작가 선생님이 내 공연을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
말로 지난 봄, 여름 사이 제의가 들어왔는데, 잘 살펴보니 60년대 배호 씨의 음악이 중심이더라.
<동백 아가씨> 앨범 후반 작업 때 제의를 받았는데 ‘서울야곡’처럼 음반 수록곡과 겹치는 노래도 있었다. 음반과 비슷한 컨셉의 음악극이라 신기했다. <천변 카바레>는 어떤 작품이고, 극 중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말로 배호 악단의 밴드 마스터로, 피아노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면서 속으로 배호 씨를 짝사랑하는 정수라는 역할이다. 밴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남장을 하는 여자다. 민철 씨는 대체 몇 명을 하는 거야?(웃음)
최민철 결국 한 사람 얘기다. 배호는 상징적인 예술가다. 한 시대를 살다 간 모두의 우상, 최고의 예술가. 극을 이끌어 가는 것은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 춘식인데, 배호 악단이 노래하던 카바레에 웨이터로 일하면서 배호를 동경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나중에 배호가 죽으면 그의 흉내를 내며 돈을 벌다 어느 순간 가짜 인생을 깨닫고 정말 배호를 기념하는 밴드 활동을 하게 된다. 10년 전에 아무도 없는 서울에 올라와 공연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도 분명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가수 배호는 젊은이들에겐 낯선 60년대의 아이콘이지만, 그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모티프로 한 일종의 주크박스 음악극이라 신선했다. 처음 대본을 읽고 어땠나?
말로 대본만 봤을 땐 조금 낯간지러웠다.(웃음) 그런데 <천변살롱>도 극으로 보니 아주 괜찮더라.
<천변 카바레>도 무대에 올라가면 괜찮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처음에 대본을 보는데, ‘소 눈망울 같은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등 표현이 간질간질하더라. 게다가 내 역할이 남장 여자였다. 작가 선생님이 ‘혹시 존 레논 닮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라고 물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웃음)
최민철 그 대사, 누나 보고 쓴 거구나!(웃음) 뮤지컬로 치면 <맘마미아>나 <올 슉 업> 같은 주크박스 음악극인 셈이다. 원래 있던 가사에 드라마를 얹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원작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만든 걸 보니 대단했다. 표현이 좀 오글거리는 것도 있는데, 60~70년대 생각해보면 휴대전화 없어서 편지하고, 손 한 번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던 시절이잖나. 그런 이해를 하고 보니 가사가 굉장히 시적으로 보이더라. 사랑한다, 외롭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거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이런 감성이 지금에는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았다.
대본에 묘사된 인물들이 두 분과 비슷하다.
최민철 맞다. 그래서 누나한테도 ‘존 레논’ 얘기를 하신 것 같다. 캐스팅이 확정되고 작가님이 나와 말로 씨를 염두에 두고 디테일한 부분을 가미하셨더라. 그런 배려 덕분에 우리가 연기하기도 편하고, 더 자연스러워졌다.
연습하면서 극과 노래를 통해 느끼는 60년대는 어떠했나?
말로 이전까지는 음악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시대였고,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라는 느낌,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었다는 정도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정서가 참 깨끗했구나 싶더라. 돈 없고 못살고, 선진적인 정치의식 같은 것은 없었어도, 마음속에 정제된 고갱이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라 그런지 노래 리듬도 심플하다.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트위스트, 재즈, 스윙, 탱고, 왈츠 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와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종류의 리듬이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을 수 있을 만큼 순수한 시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최민철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뭐든 빠르게 해결되고, 감정 표현도 굉장히 직접적인 반면, 당시엔 노래 가사, 캐릭터, 극 자체에 애타는 정서가 있다. 낭만적이고 순수해서 바보 같은 느낌. 당시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공을 들였던 것 같다. 옛날엔 정말 그랬던 것 같다.
재즈 아티스트가 보는 전통가요의 매력은? 또, 60년대 가요의 매력은?
말로 노래가 단순하고 여백이 많다. 그리고 정서를 한 겹 싼 고급스러움이 있다. 노래가 단순하고, 상상의 공간이 많을수록 뮤지션에게는 자신의 표현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텍스트다. 편곡을 하면서 발견한 60년대 가요의 매력은 ‘어쿠스틱’이다. 악기 구성이 굉장히 어쿠스틱하다. 미처 알지 못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색소폰이나 트럼펫 같은 악기가 대거 구성되어 듀크 앨링턴 밴드 같은 재즈 빅밴드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깔려있더라. 리듬도 스윙, 록으로 막 전이되기 시작한 트위스트, 탱고 등의 리듬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이미 60년대에 가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쿠스틱’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현재 재즈 뮤지션들의 마인드와 굉장히 가깝게 닿아있었다. 음악적 자양분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였던 것 같다.
최민철 60년대 음악은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심심했다. 하지만 진실한 감정이 분명 느껴졌다. 요즘 배호 씨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 가사를 듣고 있으면 시인이 조용히 시를 읊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 말에 담겨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어떻게 배호 씨와 비슷하게 부를까 고민하며 흉내를 많이 냈다. 그런데 녹음된 것을 들어보니 어색하고 흉내 내는 느낌이 많이 나더라. 노래를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가사에 담긴 정서를 진솔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 특징을 따라가 보니 어색함이 덜해지면서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 그는 시인에 가깝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


최민철 씨는 극 중에서 배호와 춘식을 넘나드는 다양한 연기와 노래를 보여줘야 하던데.
최민철 극 중에서 6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배호, 촌놈 춘식이, 그리고 춘식이가 흉내 내는 배호의 목소리, 배호의 재현 가수가 되는 배후 등을 연기적인 부분뿐 아니라 노래로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편곡의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풀어야 할 숙제다. 배호가 부르는 배호의 노래는 정말로 원곡의 느낌을 잘 살려야겠고, 배호를 흉내 내는 춘식의 노래는 멋에 취해 있어야 할 것 같고… 힘들지만 찾아가야만 하는 과정이다.
말로 씨는 이 작품의 음악감독도 맡는다. 아티스트로서는 즉흥 연주를 하는데, 텍스트가 있는 극의 음악감독을 하는 게 갑갑하지는 않은지?
말로 2005년에 극단 여행자의 연극 <소풍>의 음악감독을 했었다. 연극과 결합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나는 원래 즉흥 연주를 하는 사람인데, 연극은 짜여진 대본이 있지 않나. 배우들의 동선과 대사, 그리고 음악이 다 짜여져 있어 처음엔 지겹고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몇 번을 봐도 재미있더라. 참 안락한 느낌이랄까. 처음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지만, 볼수록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더라. 알면 알수록 재미를 느끼게 된 거다.
<천변 카바레>의 음악적 컨셉은?
말로 피아노, 베이스, 드럼, 기타, 색소폰으로 이루어진 카바레 사운드의 구성으로 갈 예정이다. 60년대 당시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라인을 현대 뮤지션이 현대 악기로 현대적인 사운드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물론 한두 곡 정도 악기 구성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변형을 가하고 싶진 않다. 재현도, 재해석도 아닌, ‘Replay’(재연주)랄까?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이나 기대되는 장면?
말로 남자 행세를 했던 정수가 춘식에게 배호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머리를 푸는 장면!
최민철 나도 그 장면! 굉장히 기대된다. 그리고 둘이 처음 만나서 피아노 앞에 앉아 ‘우리 친구 같은데 말 놓자’ 류의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따뜻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 참 좋다.
말로 난 춘식과 코러스 걸 미미의 데이트 날, 그날 하필 춘식을 찾아온 약혼녀 순심을 김밥 한 줄 사주며 기차에 태워서 억지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최민철 씨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속으로는 미안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싸가지 없이 구는 남자를 어떻게 보여줄지.
최민철 어우, 그런 연기 완전 잘하지. 왕 밥맛 연기.(좌중 폭소) 시종일관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참 재미없잖나. 보통 시골에서 올라왔다 하면 순수해서 이용당하는 역할일 텐데, 춘식이는 시골에서도 그리 좋은 애는 아니었던 것 같다. 겉멋도 많이 들고, 불손한 녀석인데, 후회도 하고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다. 너무 뻔하면 재미없잖나.
공연을 보러 올 관객들에게 한마디.
최민철 60~70년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난 시절 이야기지만, 촌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한다. 오히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감성적으로도 훨씬 풍부했던 것 같다. 영화 <고고70> 때도 느꼈지만, 그때 입었던 옷이며, 헤어스타일이며, 색감, 불렀던 노래 등은 심플함이 대세인 지금과 다른 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 <천변 카바레>에서도 그런 멋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 86호 2010년 11월 게재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