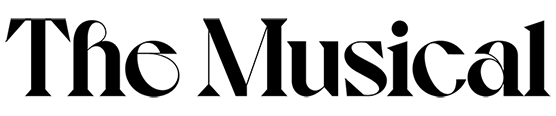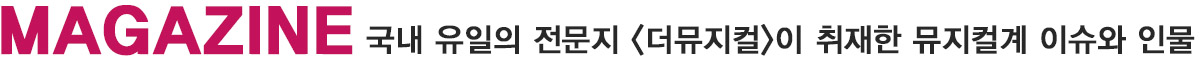엘리자베트의 도시 비엔나를 가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19세기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다. 내년 2월이면 그 고귀한 자태를 드러낼 <엘리자벳>, 그 주인공을 맡은 옥주현이 지난 11월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엘리자베트를 떠올리며 보낸 일주일의 기록을 보내주었다. - 편집자

겨울비가 조금씩 흩날리던 11월,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비엔나로 향했다. 처음엔 단순히 음악으로, 작품으로 만난 그녀지만 대본을 보면 볼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그녀에 대해 잘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 담고 비엔나에 첫발을 디뎠다.
황제와 황후의 여름 별장이자 르베이의 작업실, 쉔부른 궁전
숙소에 잠시 들러 짐을 풀고 쉔부른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여름 궁으로 사용하기 위해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져 오스트리아 황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궁전이라고 한다. 궁전 내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과 여러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방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뮤지컬 <엘리자벳>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공간이 있다. 곧은 가로수가 뻗어있는 정원을 둘러보고 있는 사이 우리를 만나러 르베이 씨가 다가왔다. 반갑게 인사하며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이분, 마치 친할아버지 같았다.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곳은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했다. 르베이 씨의 부인이신 모니카 르베이 씨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 피아노와 다양한 공연의 포스터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르베이 씨는 황후 엘리자베트가 실제로 사용했던 부채를 보여주시겠다며 작은 박스를 하나 들고 오셨다. 나를 위해 독일에서 일부러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에 그 마음이 느껴져 너무나 감사했다. 르베이 부인이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주신 검정색의 긴 부채는 루돌프 황태자의 죽음 이후 슬픔에 잠긴 엘리자베트 황후가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자 얼굴을 전부 가리기 위한 용도였다는 설명을 덧붙이셨다.

어느 순간 피아노 앞에 앉은 르베이 씨가 <엘리자벳>의 ‘나는 나만의 것’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피아노 앞에 서니 마치 오디션 장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손에 땀이 찰 정도로 잔뜩 긴장을 하고, 악보를 따라 한 소절 한 소절 노래를 불렀다. 르베이 부부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다. 두 분이 들려 준 ‘엘리자베트’의 이야기 덕분인지, 아니면 장소 덕분이었는지 노래를 부르는 짧은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오갔다. 그때의 그 소름 돋을 정도로 묘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잠시나마 내 안에 그녀가 다녀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궁 안을 돌아보면서 그녀의 흔적을 살폈다. 황제 요제프가 하루 종일 업무를 보았던 집무실, 귀족과 황실 사람들이 둘러앉아 모차르트의 연주를 들었을 듯 우아한 살롱, 상상했던 것보다는 소박했던 엘리자베트와 요제프 부부의 침실 등 문과 문을 통과할 때마다 뮤지컬 무대가 전환되듯 내 안에 그녀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실제 엘리자베트의 파우더 룸을 재현해 놓은 방에는 실물 크기의 엘리자베트 인형이 있었는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닿아 굉장히 놀랐다. 그녀는 실제로도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몸매 유지를 위해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단순히 가냘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홀로 조용히 식사를 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들의 저녁식사를 재현해 놓은 화려한 식탁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다.

씨어터 안 데르 빈
비엔나 극장 협회(VBW)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씨어터 안 데르 빈(Theater An Der Wien)으로 향했다. 대표인 토마스 드로자(Thomas Drozda) 씨와 더불어 <엘리자벳>의 초연 당시 드라마트루그이자 현재 음악감독인 쿤 슈츠(Koen Schoots) 등 이 대작을 만든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설레는 마음에 정신이 없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응원의 말씀을 들은 후, <엘리자벳>이 초연되었던 공연장을 둘러봤다. 2층에 있는 박스석. 이곳에선 왠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오페라글라스라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객석과 백 스테이지를 돌아 무대의 기계 설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 애쓰던 쿤 슈츠의 열의에 무척 감사했다. <엘리자벳> 초연 당시 무대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앙상블들이 자신들의 등장 차례를 기다리며 장면 전환 때마다 벽면에 횟수를 그렸다는 그의 이야기가 마냥 단순히 들리진 않았다. 2월에 있을 공연 오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내 마음도 그들과 같으니 말이다. 아마도 설렘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엘리자베트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씨씨 박물관
비엔나 시내 중심에 있는 합스부르크 왕궁. 그곳에 그녀의 또 다른 흔적이 있었다. 씨씨 박물관에는 실제로 입었던 드레스와 부채 그리고 치아를 치료하는 기구 등 그녀의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그녀였지만 아들이었던 황태자 루돌프(Rudolf)의 자살과 그녀 자신의 비극적 죽음 등 그 인생만큼은 결코 녹록치 않았던 듯했다. 발걸음 가는 곳마다 한없이 아름다운 비엔나에서 가슴속에 혼자 아픔을 담고 있었을 그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었을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짧은 글을 통해 잠시나마 감정이입을 해보기도 했다. ‘씨씨’는 실제로 엘리자베트의 가족과 친지들이 불렀던 애칭이다.
아들 루돌프가 죽은 이후로 줄곧 검은 옷만 입었다는 엘리자베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여행으로 견뎌냈다고 하는데, 그녀의 여행길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해 놓은 기차 내부의 모습을 통해 차창 밖을 보며 그녀는 어떤 감정으로 자신을 달랬을까 측은함이 생기기도 했다.

새로운 출발
크리스마스를 앞둔 비엔나 거리, 그 옛날 그녀도 이 거리 어딘가를 이렇게 거닐지 않았을까. 거리 곳곳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과거를 만나며 나는 엘리자베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음을 느꼈다. 시내 가득 그녀의 실루엣이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그만큼 내 마음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쉽지 않았던 왕족으로서의 삶과 한 인간으로서의 거친 인생은 엘리자베트를 단단한 황후로 거듭나게 한 것 같다. 그녀의 숨결을 따라 찾아왔던 이 도시에서 막상 그녀를 마주하고 나니, 그녀의 애처로움과 슬픔에 안타까워하기보다 나 또한 그녀처럼 강인하게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리고 이 마음을 관객들에게도 꼭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노래로, 그녀의 삶을 담은 연기로 2012년 나는 엘리자베트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99호 2012년 1월호 게재기사입니다.
*본 기사와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