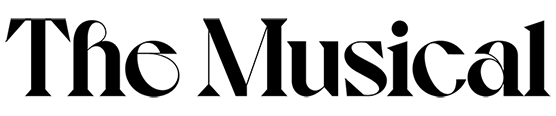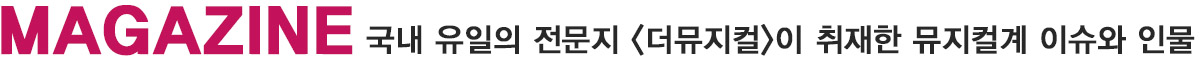뮤지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로맨스 장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로맨스 장면들이 다 로맨틱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걸 보니, 로맨스는 현실에서도 무대에서도 어려운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옛 사랑을 되짚어보듯이, 네 명의 이야기꾼이 뮤지컬 작품 속의 로맨틱한 순간들을 회고해주었다.

<렌트> ‘Light My Candle’
나는 로맨틱한 장면을 쓰는 게 참 어렵다. 가사를 쓸 땐 더욱 더 그렇다. 이제 나이도 먹어가니, 첫사랑이나 첫 만남의 설레는 순간은 더욱 아득하다. 이렇게 난관에 맞닥트리면, 늘 내 마음속 어딘가 폐허처럼 남아있을 ‘설렘’을 되살릴 처방이 있으니, 바로 <렌트>의 ‘Light My Candle’이다. ‘똑똑’ 울리는 노크 소리는 곧 그녀를 느낀 순간의 심장 박동이다. 그것은 내 맘속에 불쑥 쳐들어와 불을 붙여 달라더니, 정작 내 마음에 불을 질러놓는, 위험하고 설레는 행위이다. 물론 ‘설레는’에 방점이 찍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러다 목숨 걸게 된다, 이러지 말자는 ‘위험’을 느낀다. 그런데 그 멜로디가 이렇게 달콤하다니!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순수한 섹시’가 귀와 몸에 감긴다. 그 달콤한 멜로디에 담긴 대화는 멋지게 치장된 달콤한 시어가 아니다. 불을 빌리려는 핑계로 서로에게 이런저런 소개를 하고, 서로를 탐색한다. 그 점이 너무 좋다. 멋지게 포장한 말이 아니어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만들 수 있다니! 꼭 미사여구를 써야만 달콤한 멜로디가 가능한 것도 아니구나 용기를 얻게 된다. 연출적으로는, 일상 속에서 안무를 발견하게 된다. 촛불을 붙여주며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찾는다며 로저와 미미가 쭈그릴 때는, 소나기를 맞은 소년과 소녀처럼 서로의 몸에 대한 아찔함에 몽롱해진다. 마치 탱고를 추는 남녀처럼 밀고 당기는 유혹이 느껴진다. 거부해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매혹당하는 순간의 아찔함이 되살아나니, 고맙다, 촛불! | 조광화 (작가 겸 연출가)

<스프링 어웨이크닝> ‘The Word of Your Body’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멜랑콜리하고 로맨틱한 신을 아주 대놓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르가 뮤지컬 아닐까. 뮤지컬 좀 봤다 하는 관객이라면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멀쩡히 객석에 앉아 있다가 손발이 오글거리고 위장이 니글거리는 심리 장애 증상을 한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런 몹쓸 장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리액션은 대게 이렇다. 1. 상황이 재밌고 웃겨서 나오는 “푸하하!” 2. 배우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나오는 “웬일이니!” 3. 이도 저도 기댈 곳 없이 급당황하여 나오는 “헐!” 허나 이런 판에 박힌 대응과는 달리 고귀한 감성과 감미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아무 반응조차 못한 작품이 있었으니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바로 그것이다. 숲 속에서 우연히 만난 멜키어와 벤들라가 나란히 앉아 침만 꼴깍 삼키고 있다가 상대의 손에 자신의 손을 대보고 흠칫 놀란다. 그러고는 늪에 빠져들 듯 서로의 손길에 빠져들며 ‘The Word of Your Body’를 노래한다. 단순한 동선과 몇 가지 몸짓만으로 터질 듯한 긴장을 만들어낸 이 장면은, 그토록 많은 공연에서 키스하고 끌어안고 자극적인 꽃 대사를 분수처럼 뿜어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아찔함을 체감케 했다. 난생처음 이성의 손을 터치한 순간, 그 온도와 감촉이 주는 기분이 너무나 야릇하고 황홀해서 두근거리는 내 심장 소리에 내가 놀랐던 기억. 사랑이라고 명명하기도 부끄러운, 손등에 비치는 실핏줄처럼 희미하고 여린 감정.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인 두 사람은 그 미묘한 설렘을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승화시켰다. 보잘것없이 가난한 필력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장면이 필자가 뽑는 최고로 로맨틱한 장면이다. | 장유정 (작가 겸 연출가)

<광장의 빛> ‘Love to Me’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는 <광장의 빛(The Light in the Piazza)>의 주인공들은 많이 서툴고 부족하다. 미국에서 온 여주인공 클라라는 사고로 지능이 10대 초반에서 멈춘 상태고, 남주인공 파브리찌오는 영어로는 도저히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는 이탈리아 청년이니까. 이들 사이에는 언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여주인공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클라라는 자신에게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청년에게 이별을 고한다.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그러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 날 사랑하면 안 돼. 너는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하게 될 거야. 넌 날 제대로 보지 못해”라고. 가장 보드랍고 강한 진심을 담아 청년은 서툰 영어로 노래하며 클라라를 설득한다. “넌 혼자가 아니야, 모자가 바람에 날려 네가 그걸 쫓아가고 내가 거기 있었어. 이게 내가 아는 것, 이게 내가 보는 것, 이게 나에게 사랑이야.” 바로 이 곡 ‘Love to Me’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며, 가장 서글프지만 또한 로맨틱한 장면이다. 모든 사랑은 항상 서툴고 부족하며 치명적인 결함을 폭탄처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곡의 노래처럼 티 없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순간이 있기에. 유투브를 검색해 보시면 이 장면의 실황을 볼 수 있다. | 이지혜 (작곡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는 소재 자체가 워낙 극적이다. 군중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우리 스승이 유대인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벅찬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는 내 피와 살이고, 날이 새기 전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빈치의 작품 속에는 그 말을 마친 후 홀로 운명을 지고 고독하게 시선을 내리깔고 있는 예수와 격렬하게 반응하는 열두 제자들의 드라마틱한 몸짓들이 보인다. 아마 그것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하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예수는 고요한 슬픔과 고독을 품고 있는 다빈치의 예수와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코러스로서 안락한 노년에 대한 바람을 노래한다. 예수에게 닥칠 일과 그로 인한 고뇌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사람, 배신자 유다밖에 없다. 날이 새면 다가올 고통을 알고 있는 예수와 스승에게 그 운명의 잔을 갖다 바치는 역을 맡게 된 제자는 서로에게 독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아냐고 묻는 배신자와 그 이유 따위는 알고 싶지 않으니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악다구니를 하는 예수의 관계 구도를 흔히 하는 말로는 애증이라고 하겠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신의 아들은 유다와의 충돌에서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지금까지의 그 어떤 때보다도 온전히 사람의 얼굴을 하게 된다. 정해진 숙명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증오를 안고 파멸로 향하는 저주받은 자가 배신의 증거로 그 사람의 얼굴에 키스하면, 마지막 장의 막이 오르는 순간에 적합한 음악이 들려온다. 보통 말하는 의미의 로맨스가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뮤지컬에서 이보다 더 강렬한 로맨티시즘을 느꼈던 적이 없다. | 김영주 (더뮤지컬 기자)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107호 2012년 8월호 게재기사입니다.
*본 기사와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