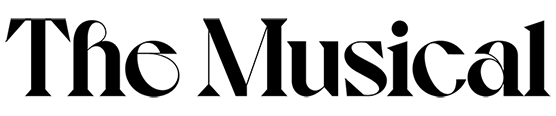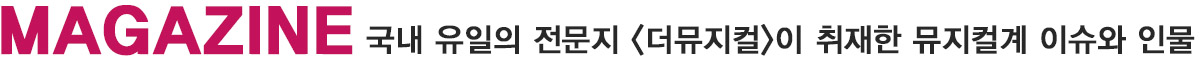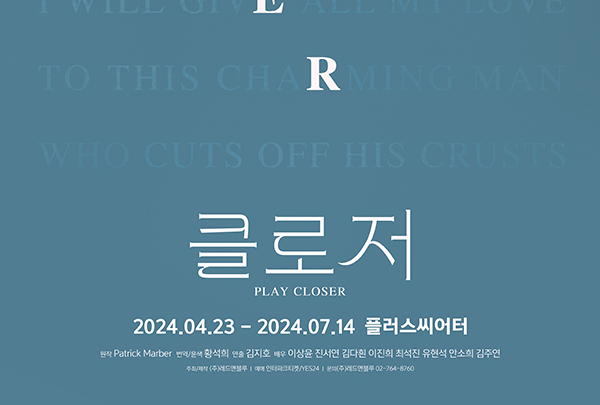짙은이 1년 5개월 만에 발표한 새 앨범 「백야」는 2인조 밴드에서 1인 체제로 변화를 선언한 성용욱에게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앨범이다.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콘서트 <백야: THE FINALE>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짙은을 만났다.

홀로서기 앨범 「백야」를 준비하면서 내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요. 무엇이 그런 생각에 미치게 한 걸까요? 슬럼프였어요. 음악을 하면서 처음으로 겪은 슬럼프. (윤)형로가 팀을 나가면서 밴드를 혼자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 전에는 음악을 한다는 게 재미있고 그 자체로 행복했다면 이번에는 운명적으로 힘든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 일이 그저 즐겁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는 부담감이나 책임감 같은 걸 느끼세요? 그런 부담감은 항상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정통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서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방법, 녹음실에서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 편곡 방법,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으로 승부하려다 보니 어려운 거죠. 항상 부담되고 어렵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음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류였던 건가요? 그렇죠. 음악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길을 찾지 않은 게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은 취미로 음악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길을 찾잖아요. 전 밴드 동아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음악을 계속하면서 직업을 찾는 시간을 유예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그런 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때는 음악이 제가 노력을 덜 들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음악을 하고 싶다기보다 음악이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처럼 느껴지고 힘들지만. (웃음)
어떤 면에서는 재능을 타고났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곡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타고났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프로들하고 저는 아예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곡이 써지고, 그걸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재미있고, 거기에 만족하는 차원이었죠.
슬럼프는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된 건가요? 네, 어느 순간 지나와 있던 거죠. 그런 감정 자체를 앨범에 담아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음반 작업을 하는 게 어쩌면 슬럼프를 이겨내는 길이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음반 자체가 어느 한 시기의 나를 기록해 놓은 무엇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시기 내 감정과 내 상태에 대한 기록이요. 이번 앨범은 특히 더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경험과 그때 했던 생각을 정리하는 느낌이죠. 좋아했던 스타일의 음악이 녹아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앨범은 보컬면에서 단단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전작이 소년 감성이었다면… 골드 미스의 감성이죠. 예전에는 예쁘게 부르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디테일을 따지지 않고 마음대로 불러 젖혔어요. ‘백야’는 허스키하게 ‘으아’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세공한 느낌이 아니라 거칠고 날것의 느낌에 가까운 노래였다고 생각해요. ‘힘 있게 갑시다!’ 이런 느낌.
발성을 바꾼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라기보다 노래에 맞는 소리를 내려고 한 거죠. 사람들은 발라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 이번 노래들이 진취적이고 선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도 갈라지고 더 이상 유약한 느낌으로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안 되는데 억지로 미성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제 나이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문라이트(Moonlight)’나 ‘마치(March)’가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색깔의 음악이기도 하고요. ‘문라이트’가 이번 앨범에서 제일 먼저 쓴 곡인데, 영화 OST에 실릴 곡을 의뢰받아서 작업한 노래예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하다기에 댄스 곡을 썼는데 거절당했죠. (웃음) 그런데 전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선샤인’도 그렇고, ‘디셈버’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삼아서 편한 마음으로 급하게 만든 노래들이 잘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웃음)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곡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랑이 진행 중일 때가 아니라 사랑이 끝나면 노래를 쓴다고 하셨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 헛소리예요. (웃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랑이라는 걸 했었나 싶은데요.
기분에 취해 한 말이었군요. (웃음) 그 인터뷰를 읽고 나서 어떤 곡이 가장 아픈 이별을 겪고 나서 쓴 곡일까 상상해 봤거든요. 이별은 다 아프죠. (한참 생각) 사실 오래 사귄 연인과의 이별보다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준비 없이 맞는 이별이 오히려 더 풍부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한여름 밤의 꿈처럼 타올랐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금세 관계가 끝이 나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디셈버’가 그렇게 쓴 곡 중 하나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 상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실상 나 혼자 사귀었다고 생각하는 관계였거든요. (웃음) 그래서 더 애틋한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순수하기도 하고.
어쩐지 플라토닉 러브의 감성이 느껴졌던 이유가 그래서였나 봐요. 실제로는 여느 다른 남자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런 노래를 쓰던 시기,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십대 중후반에 플라토닉 러브에서 그쳤던 경우가 많았어요. 짝사랑도 많이 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경험도 많고. 플라토닉 러브에 그쳤던 적이 많았죠. 그때의 감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로 남성으로서 활발했던 시기를 거쳐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시기에 도달했지만요. (웃음)

활동 마무리 콘서트 <백야>는 8회 공연 동안 각기 다른 컨셉의 공연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기획한 이유는 뭐예요? 회사에서 공연 컨셉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8회 동안 똑같은 공연을 하는 건 어쩐지 관객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여덟 번 공연하면 여덟 번을 다 보러 오는 관객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계속 같은 걸 보여줄 순 없잖아요. 관객들에게 한 회 한 회 공연이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충격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는 평범하게 음악에만 집중하는 공연을 하려고요. (웃음)
이번 콘서트의 컨셉은 용욱 씨가 직접 짠 건가요? 형이 예술 기획 쪽 일을 해서 제가 하는 음악이나 공연에 대해 비판적인 조언을 많이 해줘요. 이번에도 형이 아이디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구체적인 컨셉을 짠 거죠. 근데 사실 해외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해외 뮤지션 공연을 보다가 이 아이디어 괜찮다 싶어서 따라 한 거죠.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바꿔서.
보통은 참고했다고 하지 따라했다고 말하진 않을 텐데, 지나치게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따라한 게 맞으니까요. 그런 게 어디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원래 서로서로 따라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 공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죠.
곡을 만드는 것과 공연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공연을 한다는 건 분명 보람차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린아이처럼 공연하는 그 순간순간이 설레거나 행복하진 않아요. 음악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정서에는 한계가 있는데,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면 안 되니까. 더 깊게 들어가서 새로운 걸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롱런하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더 이상 음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곡을 받아서 부르죠. 아니면 다른 걸 하든가.
유연한 자세로 삶을 헤쳐 나가시는군요. 전 그랬어야 했어요. 안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음악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자기 방패막이 필요해서 일부러라도 “나에게 음악이 전부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번 앨범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나요? 전 음반이 나오고 나면 잘 안 듣는 편이라 벌써 너무 옛날 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앨범을 내고 나서 아쉬워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배우기도 한다는데, 전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건 그것대로 100점인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이런 식이죠. 흔히들 발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음악적으로 꼭 발전을 해야 하나 싶어요. 똑같은 걸 계속하면 안 되나 하는 마음. 솔직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잖아요. 지난 일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감성과 반짝거림으로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서울 공연에서는 어떤 무대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까진 밴드 음악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마지막 공연에서는 어쿠스틱한 분위기에 빠져드는 공연을 만들 생각이에요. 피아노 선율과 현악 편곡으로 좀 더 절절한 음악을 들려 드릴 생각입니다. 앨범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제 모든 걸 쏟아부을 공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을 축하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 105호 2012년 6월호 게재기사입니다.
* 본 기사와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