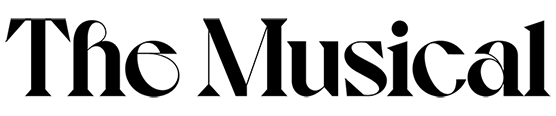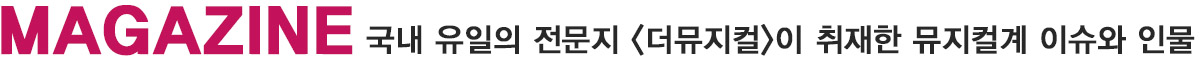이런 작품은 평론가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든다. 배우들의 기량은 가창부터 연기까지 고르게 높았고, 스펙터클한 영상까지 잘 조율해낸 연출은 안정적이었다. 예상대로 장소영의 작곡은 가사가 입에 짝짝 붙도록 만들어, 지나치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대중적이고 리드미컬한 노래를 뽑아냈고 이란영의 춤도 탈춤 스타일의 민속춤을 이용하여 맛을 냈다. 그런데 내용이, 시쳇말로 ‘뭥미?’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제 생명이 거의 끝나버린 살구나무 고목인 ‘행매’가 부르는 서곡이 끝나면, 시공간은 조선시대로 옮아간다. 조선시대 피맛골 서민들의 일상과 어우러져 서자 김생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벼슬을 할 수 없어 그곳 사람들의 소소한 일들을 도와주며 사는 김생은, 사랑하는 여자가 종으로 팔려 결혼할 수 없게 된 불쌍한 총각의 일을 도와주려고 과거에서 대리 시험 답안지를 써주고 돈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장원 급제를 한 안국동 홍생은, 어사화 꽂고 장원급제 행렬을 하면서 걸리적거리는 살구나무를 베라고 명하고, 김생은 이에 항의하다가 대리 시험 사실을 폭로해 버린다. 홍생은 김생을 끌고 가 죽이려 하는데, 그 누이동생 홍랑이 김생을 구해 별채에 숨겨놓고 치료해준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들통이 나, 김생은 한강에 던져지고 홍랑은 자결한다.
여기까지는 매끄러우나 지나치게 상투적이다. 똑똑한 서자, 역적의 자손으로 고생 끝에 억척스레 벼슬길에 오른 양반 남매, 원수지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은, 최근 사극 드라마의 단골 소재들인데, 이 내용은 그 상투형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으며 꼭 피맛골이 아니라 사직골이어도 무관한 내용이다.
제2부는 설상가상이다. 김생에게 은혜를 입은 살구나무 행매가 김생을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으로 데려오는데, 그곳은 재즈가 울려 퍼지는 1930년대 모던 경성의 피맛골이다. 그런데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하는 인물들은, 사람이 아니라 쥐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는 꼬이기 시작한다. 도대체 왜 1930년대 모던 경성에 쥐가 나오는지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쥐 세상에서 ‘얼룩꼬리쥐’와 ‘얼룩몸통쥐’가 반목하고, 그 양쪽 가문의 암수 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코믹하게 그려진다. 그리고 그 쥐들은, 김생이 홍생의 헛간에 갇혀 있을 때 보았던 쥐들의 후손들이다. 김생은 그들을 화해시키고, 쥐들은 김생을 인도하여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홍랑과 잠시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천년 한자리에 서 있다 보면 세상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느낀다는 홍매의 테마곡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2부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이다. 도대체 왜 쥐가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쥐들은 모던 경성을 구가하다가, 이승과 저승 사이를 넘나들며 사람을 이어주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비사실적 설정이란, 무언가 그 뒤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고안되는 것이다. 즉 쥐를 설정한다 해도 사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일 터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것이 없거나 너무 빈약하다. 반목을 극복한 화해? 그렇다면 그것은 1부의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1부는 단순한 반목이 아닌, 그저 우연히 꼬여버린 슬픈 사랑,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권세의 힘에 희생되는 착한 남녀 사랑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면 1, 2부의 주제적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2부는 인물들의 행동이 별 목표가 없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설정된, 반목, 화해, 만남의 주선 등으로 작위적인 연결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엉성한 줄거리를 힘겹게 메워주는 것은 노래와 춤, 배우들의 코믹한 몸짓이다.
이렇게 보자면 이 작품은 분명 파탄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작가 배삼식이 누군가. 최근 수년간 연극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이며, 미추의 마당놀이를 비롯한 여러 주문 작품들을 잘 관리해낸 구력이 있는 작가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극본을 썼다면,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이다. 돈 버는 작품이라고 무성의하게 막 썼거나, 아니면 애초의 발상이 무언가에 좌초되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품이 이끌어져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 버렸거나이다. 증거는 없으나, 내 생각에는 두 번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막 물이 오른 젊은 작가가 돈 받은 작품을 무성의하게 쓰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무언가에 걸려서 작품이 꼬여버리고, 결국 막판에는 손을 놓아버린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는 심증일 뿐이다. 녹음된 X파일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 공연 팸플릿에 약간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띈다. 팸플릿에 요약된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철거와 재개발 공사를 앞둔 종로의 피맛골. 이제는 둥치만 남은 살구나무. 거기 깃든 살구나무의 혼령 행매가 눈을 뜬다. 내일이면 뿌리째 뽑혀 사라질 신세.”(팸플릿 21쪽) 이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 공연에서는 어디에도 ‘철거 하루 전날’이라는 설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매의 노래로는 그저 수명이 다해 사라져야 할 때임을 알려줄 뿐이다. 이 노래로는 살구나무가 편안히 늙어 죽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가 늙어 죽는 것과 철거로 뽑히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닌가.
창작 과정에서 극본은 여러 번 수정되는데 팸플릿 제작 단계까지도 ‘철거’란 설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애초에 극작가의 첫 극본에서는 피맛골 철거가 매우 중요한 설정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공연에서는 이것이 사라졌다(아마 계속 축소되다가 결국 사라졌을 것이다). 그건 왜일까? 제작자이자 피맛골 철거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철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아니면 창작자들이 알아서 부담스러운 내용을 제거했거나).
그러고 보면 ‘쥐’란 설정은 ‘철거’와 어울리는 설정이다. 결국 작가는 이 작품을 철거를 앞두고 사람이 다 떠난 피맛골을 배경으로, 쥐 이야기로 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2부의 쥐 이야기가 중심이 될 터이고, 과거의 김생 사랑 이야기는 부수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쥐 이야기라는 다소 우화적 설정으로, 지금의 인간 세상과 과거의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이는 나의 추론일 뿐이다. 하지만 애초 ‘철거’ 내용이 설정되었던 것은 분명하고 ‘쥐’도 그 설정에는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데 내용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핵심 설정을 제거한 것은, 분명 인위적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추론을 하다 보면, 이 작품의 많은 부분이 이런 특정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망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더 나아가 하필이면 서울시가, 하필이면 피맛골을 제재로 뮤지컬을 만들겠다는 발상에서부터, 작가가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피맛골을 철거한 서울시가, 피맛골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무하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제작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것이다. ‘병 주고 약 주고’인 셈인데, 이런 ‘약’은 다소 불순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경우 작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피맛골 철거가 잘못되었다 또는 아쉽다고 생각하는 작가라도 그런 내용의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렇게 관이 주체가 된 작품에서, 화해가 아닌 갈등과 파탄으로 결말 맺는 새드 엔딩의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현실 속의 피맛골이 새드 엔딩이더라도 제작자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기획은 의도가 불순하므로, 애초부터 여론 호도용 비현실적 작품이거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파탄 난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미 나는 올림픽을 앞둔 1987년 88예술단(현재 서울예술단)의 창단 작품인 뮤지컬 <한강은 흐른다>에서 그런 예를 목격했다. 1980년대는 ‘아, 대한민국’ 같은 노래를 만들어 틀어대는 시대였으니 노골적으로 ‘잘살게 되었다’란 홍보성 주제를 드러내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촌스러운 관제 홍보 작품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 그러니 답이 없다! 실체적 현실을 무시한, 그러면서도 멋진 작품을 만들 묘수란 없는 것이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85호 2010년 10월 게재기사입니다.